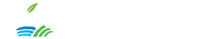페이지 정보

본문
찻잎따는 삼매수(三昧手)에
84년 노동문화제 문예부문 우수상 수상 작
조석현
나의 호젓한 방안에서 난데없이 솔바람 소리, 말 달리는 소리 요란터니, 이내 목메어 우는 듯 하다가 제 풀에 꺾였는 지 조용해진다. 물이 진정되고 뜸이 들기를 기다려 오랫동안 비워 두었던 다관(茶罐)에 물을 적신다. 산뜻한 올 햇차를 몇 숟갈 넣고 물을 부으니 갑자기 향기가 온방에 가득해진다.
옛 선인이 이르기를, 차를 딸 때는 그 묘(妙)를 다하고, 또 시기를 맞추기 힘들다 했던가? 무엇이 묘인지 아직 차맛이 어떤 것인 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유독 커피를 물리치고 처를 찾는 벽(癖)에다 꽤 까다로워진 혀 때문인 지 시중 차가 못마땅해, 올해는, 올해는 꼭 내 손으로 차를 만들어야겠다는 일념으로 오동나무꽃이 피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오동나무꽃이 시들해지고 널따란 손바닥같은 잎이 나고, 아카시아 향기가 온 산천을 뒤흔드는 5월 중순까지도 솔바람 소리를 듣지 못하고 찻잔에는 먼지가 앉았다. 남도 이 곳으로 온 지가 너 덧 달, 집에서 가져온 몇 통의 차는 술 마신 후에 좋다는 나의 시답잖은 선전(?)에 몇 달을 못 견디고 동이 났다. 덕택에 새 차를 만들 때까지 차가 없는 나는 애인을 잃은 듯 의기소침하여 새 애인이 나타나기만 고대하고 있었다. 이번 새 애인은 내 손때가 묻은 정성스럽고 사랑스러운, 정다(精茶), 정다(情茶)를 만들어야지.
그러나 결국 올해도 시간이 없어 완전한 애인(?)을 만들지 못하고 유혹(?)만 하고 온 셈이다. 그래도 하루종일 차 따기에 바빴던 내 여린 삼매수(三昧手)는 뜨거운 햇볕에 새악시 볼만큼이나 붉어지고 쓰라렸다. 그러나 허물까지 벗겨지고만 모처럼 검게 탄 팔뚝이 홀로 대견스럽다.
차벗[茶友]님들과 함께 간 보성다원은 예나 다름없이 푸르르고, 가파른 계곡 차밭에서 차 따는 아주머니의 모습들이 고향 아줌마보다도 더 정겨워 보인다. 맑은 물이 졸졸 흐르는 양동(陽洞), 이곳은 봇재 너머로 온통 차밭으로 둘러싸인 차마을[茶村]이다.
이 곳 산간 물은 수정같이 맑고 물맛 또한 별미다. 같이 간 광주시립박물관님이 차가 나는 곳은 어디나 물맛이 좋다고 하신다.
계곡을 끼고 오르니 먼저 온 남도차문화회 차벗님들이 이미 차를 따고 있다. 올라올 때 보았던 아낙들의 풍경은 일단 차밭에 들어서면 사라지고, 뙤약볕 아래서 드문드문 잎새 뒤에 숨어있는 세작(細雀)의 여린 잎을 찾기에 바쁘다.
이제 막 올라오는 여린 잎은 눈이 어두운 자에게는 잘 보이지 않는가? 아무리 열심히 따도 차바구니는 잘 불지 않는다. 나도 모르게 욕심이 생겼나 보다. 내가 딴 대부분의 찻잎은 양동 아줌마들에게 불합격품으로 판정받아 무자비하게 버려져야 했다. 찻잎을 따는 데는 정성과 끈기가 필요했다. 어서 바구니를 채워야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좋은 차를 딸 수 없게 돼버린 것 같다.
그런데 이건 또 웬일인가? 팔뚝이 쓰려오기 시작한 것이다. 나 혼자 미련스럽게 덥다고 긴팔 옷을 입지 않고 있음을 발견했다. 결국 팔은 붉게 익어 버리고 귀여운 후배가 만져줌에도 불구하고 쓰리고 아려온다.
오후에는 나름대로 여린 잎을 선별하는 안목과 조금의 요령이 생겼나보다. 찻잎의 질도 좋아지고.... 그러나 여전히 찻잎은 잘 불지 않는다. 몇 번을 훑어 따 버린 까닭이다. 차라리 몇 주가 지나야 새싹들이 나올 것 같다. 결국 경험없는 우리들은 차밭과 차 따는 시기를 잘 고르지 못한 것이다.
오후가 되자, 오전에 잘도 조잘대던 잎도 다물고 오직 묵묵이 부지런히 찻잎 위로 손을 놀려댔다. 동다송(東茶頌)의 한 구절이 생각난다. 「찻잎 따는 삼매수에 기이한 향기 피어나네(三昧手中上奇芬)」 선(禪)이 별건가? 찻잎 따는 이 삼매수에 찻잎 위에 도(道)닦는 청개구리 놀라 뛰네.
‘가만히 앉아 차향기 은은하니, 차 한 잔에 꽃 피고 물 흐르네(靜坐處茶半香初 妙用時水流花開)’ 추사(秋史)의 이 선다송(禪茶頌)은 차밭에서 도 닦던 은자(隱者) 다전(茶田) 청와선생(靑蛙先生)의 심경(心境)이었을까?
비가 후두둑거리고 산골마을에 어둠이 먼저 내려온다, 막차를 원망하며 한길가로 올라 차밭골을 바라보니 모우(暮雨)가 가득하다. 남은 차벗님들은 추녀에서 떨어지는 빗소리를 그윽이 들으며 날이 새도록 차를 덖으며 비비겠지. 이 반도 그 차벗들은 손수 빚은 새 햇차의 그윽한 향기를 맡고 있겠지. 나의 덜 된 애인도 거기 한 못 끼어 있을까?

- 이전글조선 후기 보성의 다인과 차생활 21.03.08
- 다음글'다반향초(茶半香初)' 차시에 관한 연구 21.03.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